1. 서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숭아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여주, 이천, 장호원, 충북 청주 등 내륙지방에서는 겨울철 저온으로 심한 동해를 입어 나무가 죽거나 꽃눈 피해로 수량이 감소하는 등 수확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다(RDA, 2020). 또한, 복숭아는 상온 유통 시 쉽게 변질되어 부패될 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과 달리 장기간 저온 저장을 하면 식미도가 감소하므로 장기 저온 저장이 곤란하기에 신속한 거래가 필요한 과실이다(Park, 2010). 특히 복숭아의 경우 대부분 고온기인 여름철에 유통되므로 쉽게 물러져 변질된다. 이에 복숭아의 향미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다른 과일에 비해 호흡량이 많아 쉽게 과육이 물러지며 10%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면 상품의 가치를 잃어 주류 등 장기 저장이 필요한 가공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Lee,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홍 복숭아는 2006년 강원 홍천군 남면에서 민간 육종 과수품종 1호(품종보호 제1586호)로 등록되었으며, 국립종자원에서 우수품종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강원 홍천지역 110 농가 36 ha에서 재배되어 약 300톤이 생산되었으며, 연간 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22. 9월 기준). 대홍 복숭아는 이름처럼 과일이 크고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과육의 모양이 한우의 꽃등심과 같이 빨간색 바탕에 눈이 내린 듯한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눈과 입을 만족시키고 있다(Kangwon Media, 2021). 일반 복숭아와 달리 장기 보관이 가능해 빨리 무르는 복숭아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과중은 350 g으로 대과종, 당도는 13.0 °brix 이상으로 고당도 복숭아이며, 수확기는 7월 하순에서 9월 상순으로 장기간 수확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 2019). 따라서 대홍 복숭아는 다른 품종보다 가공용으로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품종 보급을 위해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고품질 지역특산주 개발을 위한 양조공정을 본 연구에서 확립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홍 복숭아는 2022년 강원 홍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한 복숭아를 사용하였으며, 쌀은 2021년 수확하여 2022년 도정한 삼광미(경북 경주), 누룩은 ㈜조은곡식(경기 화성)에서 판매하는 백국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백미 5 kg을 10회 이상 깨끗하게 씻어 1시간 동안 수침한 다음, 1시간 동안 물빼기를 수행하였다. 쌀을 증자기(MS-30, Yaegaki Food & System Inc., Himeji, Japan)에 넣고 1시간 동안 증기를 가해 고두밥을 제조하였다. 여기에 백국 2.5 kg과 가수량을 전분질 원료양의 180%로 추가하였다. 이때 가수량의 0, 10, 15, 20%를 복숭아 착즙액(NNJ-1415JM, NUC. Co., Ltd., Daegu, Korea)으로 대체하였다. 술덧양의 0.1%의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N9(KACC 93234P)를 접종한 후 25℃에서 매일 1회 교반하여 무게편차가 2 g 미만일 때까지 발효를 진행하였다(Kang 등, 2016).
상압증류는 alambic 구리 증류기를 변형하여 제작한 대우기계사(Seoul, Korea)의 상압단식 증류기를 사용하였으며, 감압증류는 원심농축기(Yarong rotating evaporator RE5220, Shanghai Yarong, Shanghai, Chaina)를 사용하였다. 술덧 4.5 L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시작 후 약 20분에 첫 증류액이 나오기 시작하여 분당 30 mL의 속도로 증류액이 유출되는 조건으로 하였다. 증류액은 별도로 분획하지 않고 처음 증류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받기 시작하여 증류액의 알코올 함량이 10%가 될 때 종료하였다. 냉각수는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최종 증류액은 활성탄 및 벤토나이트로 여과한 다음 알코올이 25% 되게 희석한 후 유리병에 담아 15℃에서 1주일 보관하였다가 분석하였다. 증류수율은 술덧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 대비 증류주의 알코올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Shin 등, 2022).
알코올, pH, 총산, 휘발산 함량은 국세청 주류분석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National Tax Service, 2020).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시료 100 mL에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증류하였다. 증류액 약 80 mL를 받고 증류수로 100 mL까지 정용한 후 증류액을 15°C로 조정하여 간이 알코올 분석기(AL-3, RIKEN KEIK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H는 pH 미터기(Metrohm 691, Metrohm, Herisau, Switzerland)로 상온에서 측정하였으며, 총산은 시료 10 mL를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1 N NaOH 용액이 소비된 mL 수(산도)를 acetic acid로 적정한 값으로 환산하였다.
휘발산은 증류액 10 mL에 phenolphthalein을 2-3방울 가하여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01 N NaOH 용액의 양을 acetic acid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Acetaldehyde 분석을 위해 분석 키트(Acetaldehyde assay kit, Megazyme Ltd., Bray, Ireland)를 사용하였다. 증류액 0.1 mL에 식염수 2 mL를 더한 용액에 buffer 0.2 mL(solution 1)와 NAD+ 0.2 mL(solution 2)를 차례로 추가하였다. 본 용액을 밀폐 후 잘 혼합하여 2분 방치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A1). 이때 blank는 증류액 대신 식염수 2.1 mL를, 기준물질은 식염수 2.0 mL에 표준용액 0.1 mL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Acetaldehyde dehydrogenase 0.05 mL는 4분 방치 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A2).
c = (0.7159 /ε) × ΔA (g acetaldehyde / l sample solution)
Contentacetaldehyde = (cacetaldehyde (g/L sample solution) ÷ weightsample in g/L sample solution) × 10 (mg/L)
Furfural은 증류액을 2 mL 측정 시료 용기에 넣어 분광광도계(UV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2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Lee 등, 2015).
휘발성 향기성분은 Gas chromatography(GC, GC2010, Shimadzu C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용 column은 HP-INNOWAX(60 m×0.25 mm I.d.×0.25 μ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Agilent Co., Folsom,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flame ionization detector(FID)로 검출하였다. Column oven의 온도는 45°C(5분 holding), 5°C/분 승온, 100°C(5분), 10°C/분 승온, 200°C(10분)로 프로그램하였다. 운반가스(carrier gas)는 질소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22.0 cm/초(linear velocity), split ratio는 50:1로 설정하였고 주입기의 온도는 250°C, 검출기의 온도는 280°C로 하였다. 시료는 증류 후 여과(0.2 μm, Millipore Co.)한 다음 바로 주입하였다(Shin 등, 2021).
다중향기성분 분석을 위해 시료 5 mL를 20 mL vial (Ls-Phs-Psck GmbH, Langerwehe, Germany)에 넣고, 40°C에서 30분간 500 rpm으로 교반하고 전자코(Heracles NEO electronic nose, Alpha Mos, Toulouse,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분석에는 두 개의 column이 부착된 Heracles E-nose(MTX-5 and MTX-1701)가 사용되었으며, FID로 검출하였다. Injection은 syringe type으로 column 온도가 25°C로 유지된 상태에서 column head pressure 1.0 psi로 주입하였다. 분석 시 injector의 온도는 200°C, detector 260°C로 하고 injector pressure는 1.0 psi, detector pressure는 39.0 psi로 하였다. 데이터 통계처리는 Alpha MOS Software를 사용하여 판별분석법(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으로 나타내었다(Kang 등, 2020).
3. 결과 및 고찰
대홍 복숭아 증류주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증류수율의 경우 액체 술덧의 평균 수율은 93-96% 정도인 것에 비해 복숭아 증류주 상압증류 수율은 97.46-101.43%, 감압증류 소주의 증류수율은 89.73-97.27%로 나타났다. 감압증류의 경우 열전달 환경에 영향을 받아 펌프의 감압력에 의해 스팀이 술덧 입자 사이의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동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증류수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Shin 등, 2022). 휘발산 함량은 상압방식과 감압방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주로 초산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추정하는데 주로 증류주의 자극취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인 증류주의 경우 0.1% 미만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15). 본 연구에서 나타난 휘발산 함량은 상압증류주는 0.00048-0.00124%, 감압 증류주의 경우 0.00053-0.00128%로 나타나 증류주의 자극취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조구(쌀 증류주)보다 복숭아 20% 증류주의 휘발산 함량이 상압, 감압 증류주에서 각각 42.42%, 41.26% 감소되어 자극취 발생원인이 함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홍 복숭아 착즙액별 증류주의 휘발성 성분은 Table 2와 같다. 발효주 증류 시 알코올 등 각종 휘발성분은 농축되면서 방향성분이 생성되어 전체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Kim 등, 2009). 에탄올, 메탄올 등은 증류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며, acetaldehyde 등은 증류 초기 모두 유출되어 회수가 가능하며, furfural 등은 증류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증류주 숙성 초기단계에는 acetaldehyde 등이 제거되어 자극적인 향이 감소되며, 중기단계에는 증류주의 카르보닐 화합물(carbonyl compounds)의 증축합 반응(polymerization)이 형성되며, 3년 이상 장기 숙성 시에는 지방산의 에스테르 생성, 퓨젤유의 향기성분의 농축, 물과 알코올의 화합에 의한 맛의 조화가 증가된다(Kim 등, 2009). 증류주의 향기성분은 발효과정보다 숙성과정에서 주로 생성되는데 주성분인 에틸알코올 외 알코올류, 에스테르류, 알데히드류, 유기산류, 페놀류 등 많은 성분으로 구성된다. 증류주 특유의 향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자 중 하나인 퓨젤유에는 n-propanol, isobutanol, n-butanol, isoamylalcohol, n-amylalcohol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퓨젤유는 탈아미노, 탈탄산작용을 거쳐 생성되며, 원료 중의 아미노산 함량, 사용균주, 증류조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Jung 등, 2021). Acetaldehyde는 효모의 알코올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데(Park 등, 2006) 과실향이나 녹색풀과 같은 향을 가지고 있으며, 90%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역치값이 83 mg/L로 높아 강력한 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만 안정성 문제로 국내 식품공전상 증류주의 경우 700 mg/L 이하(리큐르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3).
본 연구에서 검출된 대홍 복숭아 증류주의 acetaldehyde 함량은 상압증류의 경우 33.16-39.29 mg/L, 감압증류의 경우 17.12-28.23 mg/L로 나타나 상압증류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모든 처리구에서 규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대홍 복숭아 증류주에서 자극취 등 부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복숭아 증류주 내 methanol 함량은 검출되지 않아 식품공전상 규제기준(1,000 mg/L, 곡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 및 소주, 위스키는 500 mg/L 이하)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증류주의 탄내 성분인 furfural의 경우 유의적이지 않지만 상압증류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Furfural은 술덧에 함유된 탄수화물(전분, 당분, 펜토산 등)의 가열 분해 시 산과 가열에 의해 생성된다. 일반 쌀로 제조된 증류주의 경우 상압방식에서 0.18, 감압 방식에서 0.11 mg%로 나타나며, 고체발효 증류주인 마이타이주는 8.0 mg%로 나타나(Bae, 2003), 감압방식보다 상압방식에서 푸르푸랄 함량이 높고 액체발효보다 고체발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휘발성 성분(Table 3)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은 isoamyl alcohol, 1-propanol 순으로 나타났다. Isoamylalcohol은 약품냄새와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고, 저비점의 에탄올과 함께 주류의 전체적인 향을 형성한다. 1-Propanol은 알코올향으로 threonine이 탈아미노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Kwon 등, 2023). 본 연구에서 isoamyl alcohol 및 1-propanol은 대홍 복숭아 함량과 비례하여 증가하면서 증류주의 쓴맛과 알코올향을 주로 형성하여 향기성분의 패턴이 구별되는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코를 활용한 복숭아 착즙액 비율별 증류주의 향패턴 판별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판별분석은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통해 집단을 판별하거나 분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Choi 등, 2017)으로, 본 연구에서 증류주의 향 패턴 판별 분석의 설명력은 전체 85.053% (DF 1: 63.598%, DF 2: 21.455%)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는 DF 1(x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대홍 복숭아 0%, 10% 첨가구가, 좌측으로 15%, 20%가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홍 복숭아를 첨가하지 않은 0% 처리구와 20% 처리구의 위치가 가장 상반되어 나타났으며 증류방식에 따른 향패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복숭아 착즙액 증류주의 경우 복숭아 첨가비율별 향 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20% 이상 함유 시 대홍 복숭아 무첨가 증류주(쌀 증류주)와 확연히 다른 증류주의 향 패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휘발성 성분(Table 3)과 연계하여 보면 쓴맛과 알코올향을 나타내는 isoamyl alcohol 및 1-propanol로 인해 대홍 복숭아 20% 이상 함유 시 향 패턴이 구별되는 증류주가 제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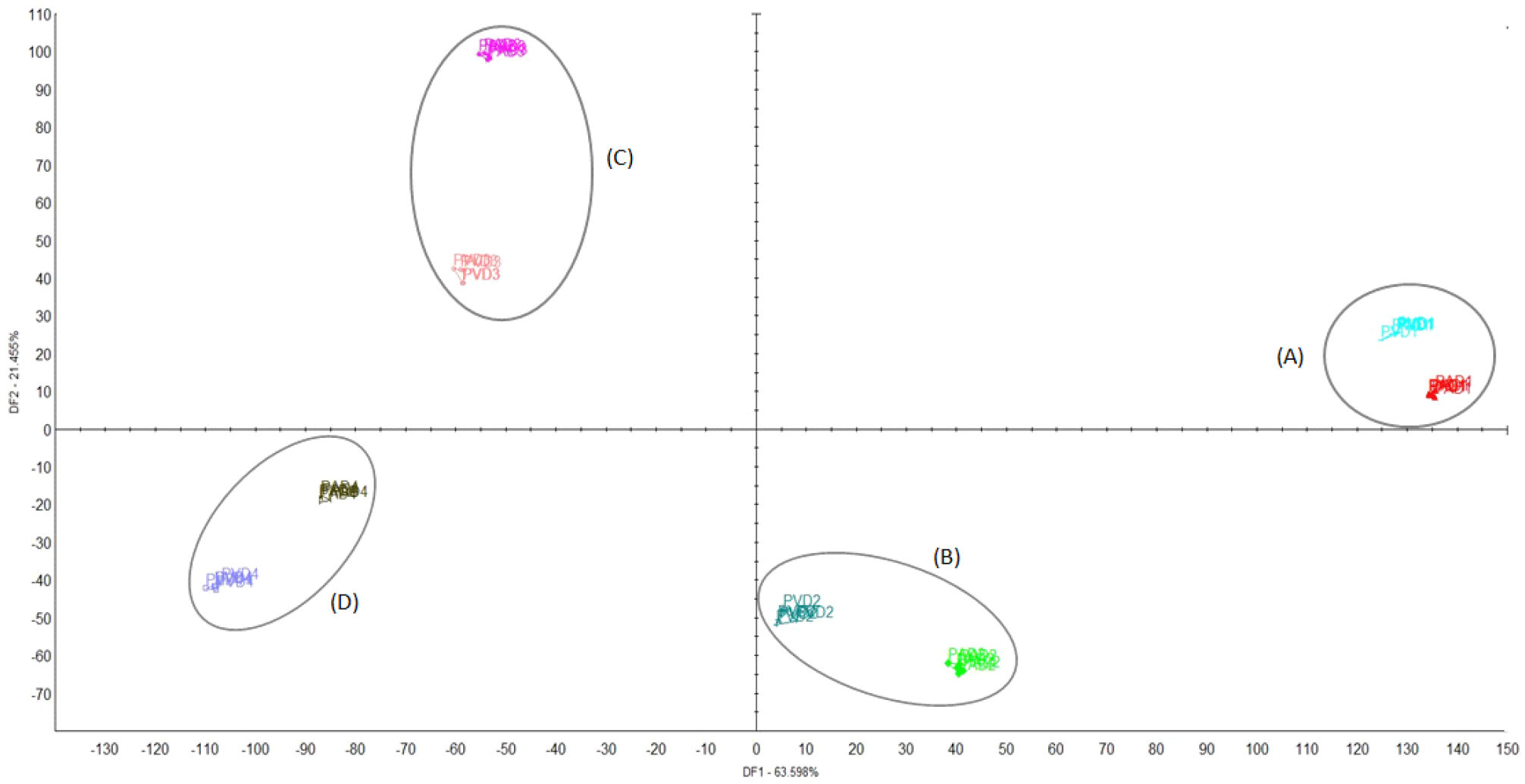
4. 요약
대홍 복숭아를 함유한 증류주의 품질특성을 살펴본 결과, 알코올 함량은 상압 증류에서 47.90-50.60%, 감압 증류에서 41.30-45.20%로 상압증류방식의 증류수율이 1.12-1.16배 높게 나타났으며, 복숭아 첨가량 20% 처리구에서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휘발산 함량은 상압 및 감압증류 모두 복숭아 함량이 20% 첨가된 처리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자극취를 발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식품공전상 증류주의 규격인 acetaldehyde는 상압증류에서 33.16-39.29 mg/L, 감압증류에서 17.12-28.23 mg/L로 감압증류 시 1.39-1.94배 낮게 나타났으며, methanol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증류 시 발생하는 탄내성분인 furfural의 흡광도값은 상압증류 시 30-60, 감압증류 시 10-40으로 나타나 상압증류에서 탄내 등 자극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처리구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살펴본 결과 약간의 쓴맛을 나타내는 isoamylalcohol과 알코올향을 발현하는 1-propanol이 주성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복숭아 첨가량 20%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코 분석결과 또한 20% 처리구는 대조구와 가장 상반되는 향기패턴을 보여 대홍 복숭아를 20% 첨가하여 감압방식으로 증류하였을 때 자극취가 적고 향 패턴이 구별되는 품질의 증류주가 제조될 수 있다.
